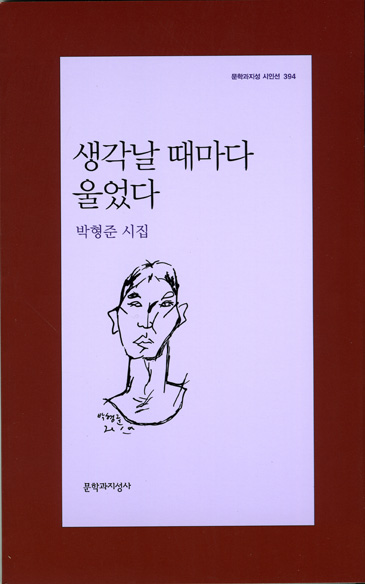남아있는 한 조각
장은정
하루 중에서 박형준의 시에 가장 어울리는 시간이 있다면 그것은 단연 해가 지는 무렵일 것이다. 붉음과 어둠이 불길하게 뒤섞이는 이 시간에 대해 『물속까지 잎사귀가 피어있다』에서 그는 이미 단 한 줄로 시를 쓴 적이 있다. “알 속에서 이미 날개를 편 새”(「저녁 노을」). 그 시간을 지나 찾아오는 밤은 “날아다니는 동물”과도 같아서 어린 화자는 석유를 먹고 온 몸에 물집이 잡혔다. 아버지가 아이를 안고 강가로 달리던 장면은 여전히 쉽게 잊히지 않는다(「백열등이 켜진 빈집」). 그래서 그 동안 박형준의 시를 함께 읽어온 독자라면 이번 『생각날 때마다 울었다』의 첫 시를 보고 어딘가 울컥하는 기분을 느끼게 된다. 왜냐하면 아이를 안고 달리던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화려하고 불길한 색감으로 묘사되었던 “저녁 노을”은 이제 “아버지 삼우제 끝나고/식구들, 산소에 앉아 밥을” 먹을 때 바라보는 “황혼”이 되어있다. 그 어둑한 빛에서 화자는 “창호지 안쪽에 배어든/초롱불”을 보고 “아버지가 삐걱 문을 열고 나올 것 같다”고 쓴다. 이제 해가 질 무렵의 시간은 이미지 자체라기보다 더욱 기억에 의존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중요한 변화는 제 1부 “아버지의 죽음에 바치는 노래”에서 시론으로 더욱 확장되고 있다. 시들은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 자신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갈 것인가를 가만가만 손가락으로 조용히 짚어간다. 거슬러 오는 동시에 미리 앞질러 가보는 것. 그래서 이 시들은 단순히 ‘애도가’가 아니며 ‘죽음에 관한 시들’이라고도 정리되지 않는다. 아버지는 생을 통과한 후에 비로소 죽음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빗속에서 어린 시절 아버지가 만들어주던 밀가루 떡의 냄새를 맡거나(「별식(別食)」젊은 아버지의 시절을 거슬러 올라가보는(「꼬리조팝나무」) 시들은 아버지의 죽음이라기보다 삶에 가깝다. 이렇듯 시를 통해 아버지의 삶을 반추해보던 화자는 깨닫게 된다. 그의 삶이 “침묵”(「시집」)이었음을. 그 침묵의 삶은 아들이 쓰는 시를 “글씨”라고 부르곤 했었다(「가을밤 귀뚜라미 울음」).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신 날/새 시집이 나왔다”는 구절은 의미심장하다. 침묵이 바람처럼 잦아든 후에야 시가 시작되는 것. 언어 이전에 삶이 있다는, 겸손하고 오래된 믿음은 “너는 삶 대신 이미지를 택했다.”(「서커스」)고 지적한다. 시인이 직접 뒤표지 글에서 자신의 시를 “기억을 향해 날을 세우고 있는 부재의 이미지”라고 쓴 것은 바로 이러한 변화를 기반에 두고 있다.
그동안 우리가 읽어온 박형준의 시가 삶과 죽음이 기묘하게 결합된 그로테스크한 색상이었다면, 이제 이 색은 삶을 잃은 이미지로 의미화 된다. 「당신의 팔」이 대표적이다. “당신의 팔 속에서/강물 흐르는 소리가 난다”는 1연의 서정적 진술은 “사람이 사랑을/사랑이 사람을/못 믿고/사랑을 사람이 두고/못 믿”는다는 인식에 이른다. 그 때문에 “당신의 팔”은 “정육점 같은 팔”로서 일종의 고깃덩어리로, “강물”은 “고기 같은 강물”로 명명되는 것이다. 그러니 결국 “나는 언제나/당신의 팔에서 타인을 사랑”하고 “언제나 당신의 팔 속에서 죽”고 만다. 이미 “인간의 언어”를 알아버린 시인에게 아버지와 같은 “침묵의 삶”은 허락되지 않기에 언어는 삶에 가닿을 수 없고 시는 “가만히 펼쳐진 채 묘혈처럼 깊”어지는 것(「시집」)이다.
삶이 제거된 이미지로서 이번 시집에 자주 등장하는 것 중 하나가 ‘빛’이다. 중요한 것은 그 빛이 태양의 빛이 아니라는 점이다. “해가 들지 않는 곳에서”(「해가 들지 않는 곳에서 빛이 내릴 때」) 내리는 빛이기에, “희한하게 빗속에서” 떠다니는 “빛들”에(「여우비」) 가깝다고나 할까. 본래 빛은 로고스로서의 진리를 상징해왔다. 하지만 박형준의 이번 시집에서 ‘빛’은 삶을 잃고 이미지로 존재하는 병든 빛에 가깝다. 「저녁 빛」에서는 그 동안 그의 시에서 중심을 이루는 저녁이라는 시간이 ‘빛’으로 형상화되면서 이미지로서의 저녁으로 고조되고 있다. 이때의 저녁은 “사물 속에 빛나는 고통”과도 같아서 노을은 “부드러운 상처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별들로/또 하나의 성좌를 이룬다”. “수평선의 빛”은 이제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다.
빛이 고통인 이유는 분명하다. 그것은 부재의 이미지이므로 더욱 간절히 ‘있음’을 요구하고, 그러한 요구 속에서 지금의 ‘없음’을 더욱 확연하게 드러내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빛을 “남은 빛”이라고 명명하는 순간, 그것은 삶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된다. 이것은 결여의 이름이 아니라 삶의 아주 작은 조각의 이름인 것이다. 제 1부 <아버지의 죽음에 바치는 노래>로부터 시작한 박형준의 시가 제 3부 <남은 빛>에 이르러 그 언어에 관한 자의식이 점차 더욱 섬세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삶의 한 조각이 언어라면, 그것은 당연히 “침묵으로 남은 빛”일 것이고 ‘침묵’인 삶을 쓸 수 있는 마지막 가능성일 것. 다만 그 가능성은 “너의 눈과 나의 눈에서 흐르는/눈물”로써만 피어나는 “꽃”과도 같다.
시적 언어에 관한 이러한 자의식 속에서 읽을 때, 표제시 「생각날 때마다 울었다」는 더욱 크게 울린다. 이 시는 우선 가난했던 한 젊은이의 사랑 이야기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사과나무의 꼭대기”만 보이는 지하방에 사는 한 젊은이와 작은 열매처럼 찾아온 사랑. 맨방바닥에서 나누던 사랑 끝에 낙과처럼 그녀가 떠났고 젊은이는 그녀를 기다리며 꽃무늬 요를 가만히 접어놓는다. 마침내 다시 그녀가 돌아왔을 때에야 지하방엔 꽃이 활짝 피어나는데, 마지막 연 “사과나무의 꼭대기,/생각날 때에만 울었다”를 읽고 나면 그녀가 이젠 영영 떠났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읽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만약 그녀가 우리가 끝내 잃어버린 ‘침묵의 삶’이라면, 사과나무 꼭대기야말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빛”은 아닐까. “생각날 때마다 울”수 있는 것은 아직 “사과나무 꼭대기,”를 잊지 않았다는 증거니까.
_《문학과사회》 2011년 가을호 발표.
'리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한희정 《공간반응》 앨범 소개 (2) | 2022.11.07 |
|---|---|
| 김이듬, 『말할 수 없는 애인』(문지, 2011) 리뷰 (0) | 2020.01.19 |
| 유희경, 『오늘 아침 단어』(문지, 2011) 리뷰 (0) | 2020.01.19 |
| 김성대, 『귀 없는 토끼에 대한 소수의견』(민음사, 2010) 리뷰 (0) | 2020.01.19 |
| 최치언, 『어떤 선물은 피를 요구한다』(문지, 2010) 리뷰 (0) | 2020.0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