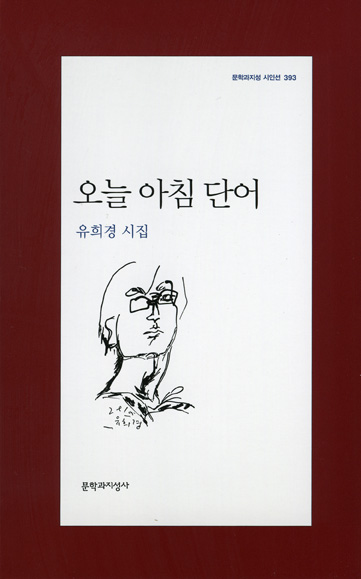
알지 못하는 것들
장은정
유희경의 『오늘 아침 단어』에서 쉽게 마주칠 수 있는 것은 가장 개별적인 차원의 시적 감정에 관한 시들일 것이다. 가령 티셔츠에 목을 넣는 순간을 떠올려보자. 그 순간은 어느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는 가장 개별적인 시간이다. 그야말로 화자만이 겪는, 완전히 밀폐된 순간. 이런 순간을 시로 쓴다는 것은 예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더라도, 시를 당장 ‘여기 지금’으로 만들어 놓는다. 흥미로운 것은 그것이 개별적인 것이라 해도 1인칭의 그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감정이라는 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꽃처럼 시시각각 모양이 달라지는 것이어서 스스로에게 차오르는 마음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1인칭 내부에 북적이는 전혀 다른 이질적인 감정들을 바라보아야 한다. 「속으로 내리는」은 바로 이 이질적 감정들이 동시에 존재하는 순간을 잘 보여주는 시편이다. “원망하는 시간”과 “그만 갔으면 좋겠다가도 멈출까 봐 두려운 시간”, “너인 시간”이며 “네가 아닌 시간”인 동시에 “너를 생각하는 나도 아닌 시간”이 모두 함께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 이 시집에서 풀어놓는 마음의 결을 세세하게 엿듣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가만히 짐작해보고 있는 이 시간이 어째서 도래하게 된 것인지를 생각하는 편이 더욱 흥미로운 것 같다. 「K」는 그 과정을 역추적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시편이다. 백발의 K는 창가에 서 있다. “그는 나와 눈이 마주쳤음에도, 물러서거나 시선을 피할 생각이 없어 보였다. 창밖에는 바람이 앞에서 뒤로, 쓰러질 것처럼 불고 있었다.” 창을 사이에 두고 K와 나는 서로 다른 공간에 있다는 점에서 분리된 동시에 서로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볼 수 없는 것과도 같다. “K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 수 없다. 그게 나를 미치게 만든다.” 그를 바라볼수록 알 수 있는 것이라곤 지금 자신이 바라보는 것은 “K를 생각하는 태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타자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반응의 바깥”에 위치해 있다. “그는 수천의 나비가 만들어낸 사람”인 것. 그렇게 타자에 대해 알 수 없다는 사실은 더더욱 알 수 없는 ‘우리’를 만들어낸다.
「K」가 닿을 수 없는 ‘너’에 관한 시였다면, 「내일, 내일」은 ‘우리’에 관한 시다. 둘은 “잘못 배달된 도시락처럼 말없이,” 마주 앉아 있다. 그들은 “서로의 눈썹을 향하여 손가락을, 이마를, 흐트러져 뚜렷해지지 않는 그림자를, 나란히 놓아둔 채 흐르는” 중이다. “오른쪽에 왼손을 대고 싶어져 마음”이 “무럭무럭 자라난다”. 「궤적」 역시 “나와 다른 한 명이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거대한 구름이 밀려오고 있었다.” 둘은 어떤 대화를 나누었지만 사실 “각각 무슨 말을 했는데 중요한 건 아니었다.” 그야말로 “어쩌면 구름은, 그냥 보이는 것이”니까. 곧 다른 한명이 나무의자에서 떠나고 나만 홀로 남아 있는 것으로 시는 끝난다. 이 우리에 관한 시편들의 방향은 모두 동일하다. 타자로 향한 마음들은 창가처럼 단단한 유리에 부딪히고 그 유리가 유리 너머를 더욱 상상하게 만든다. 그 상상하는 마음들은 다시 ‘나’에게로 되돌아온다. 결국 끝없이 자기 자신으로 환원되는 것. 여기에는 어떤 깊은 무기력이 존재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그 무기력이 북적이던 모든 감정을 의심하는 순간에 다다르게 한다는 것이다. 「深情」이 대표적이다. 누군가가 “나를 물속으로 던졌다”는 진술 뒤에 의심이 따라붙는다. 어쩌면 그가 나를 물속에 던진 것이 아닐 것이라는 의심이 아니라, “물은 우리의 착각일지도 모른다”는 의심. “나는 물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의심. 감정에 대한 비유로 읽히는 ‘물’에 대한 의심이 인상적인 것은 이것이 그의 시 전반에 대한 의심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째서 그러한가. 3연을 보자. “나는 물 아래로 흘러갔다/그때 나는 얼굴이 없었다/얼굴이 없어 눈물도 없었다/표정은 우리의 오해일지도 모른다”. 물에 대한 의심은 얼굴과 눈물, 표정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의심은 모든 감정을 흘러가게 하고 굳어가는 자세만을 남겨놓는다. “파쇄된 리듬처럼 굳어버”리게 되는 것.
물론 이러한 슬픔들, 무기력들, 의심은 관계의 불가능성에서 기인하고 있다. 하지만 그보다 더욱 근원적인 기원을 따라가자면, 어쩌면 이 시집에 실린 모든 시가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은 아닐까. “없어진 나날보다/있었던 나날이 더 슬”픈 것(「텅 빈 액자」)이다. 그의 시는 “택시에서 내려 문을 닫고 오늘 닫은 몇 번째 문인지 곰곰이 생각”하는 것에 가깝다. “문 뒤에는 또 문이 있고 문 뒤의 당신은 아직도 깜깜”한 것(「부드러운 그늘」)이다. 그렇게 일어난 일들의 문을 열어보고, 또 열어보면 또 다른 문이 나온다. 마지막 문은 「면목동」이다. 아내와 남편이 있다. 아내는 소주를 마시고 내내 울고 있고, 남편은 아내를 업고 대문을 나선다. 남편은 아내가 왜 울었는지 모른다. 유희경 시가 대부분 타자에 대해 그저 짐작만 하듯, 남편 역시 “미끄러지는 아내를 추스르며 빈 병이 되었다”. 이 연인 사이에서 조용히 ‘나’가 등장한다. “거기에 내가 있었다는 것을 모르는 건 남편과 아내 뿐이었다 마음에 피가 돌기 시작했다” 이렇게 유희경 시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했던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 시편까지 읽고 나면 이 시집이 일렁이는 마음들이 처음 생겨난 기원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내 안에서 흔들리는 마음조차 알 수 없는 이유는 가장 최초부터 우리의 존재는 아무도 모르는 순간 생겨났던 것. 시는 그 모르는 것들에게 자리를 내어준다.
_《시와 사상》 2011년 여름호 발표.
'리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김이듬, 『말할 수 없는 애인』(문지, 2011) 리뷰 (0) | 2020.01.19 |
|---|---|
| 박형준, 『생각날 때마다 울었다』(문지, 2011) 리뷰 (0) | 2020.01.19 |
| 김성대, 『귀 없는 토끼에 대한 소수의견』(민음사, 2010) 리뷰 (0) | 2020.01.19 |
| 최치언, 『어떤 선물은 피를 요구한다』(문지, 2010) 리뷰 (0) | 2020.01.18 |
| 김행숙, 『타인의 의미』(민음사, 2010) 리뷰 (0) | 2020.01.18 |